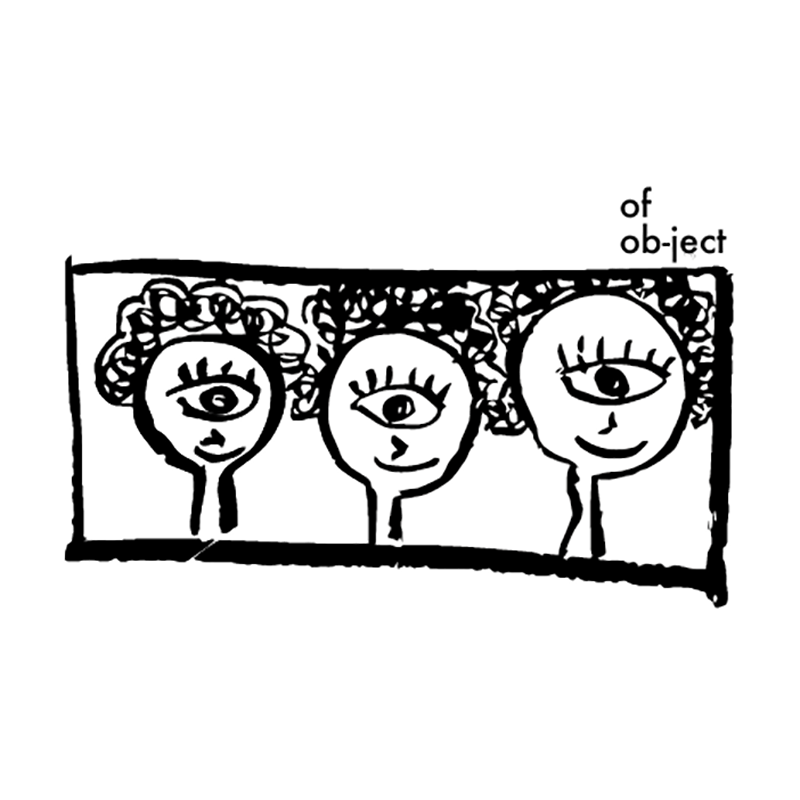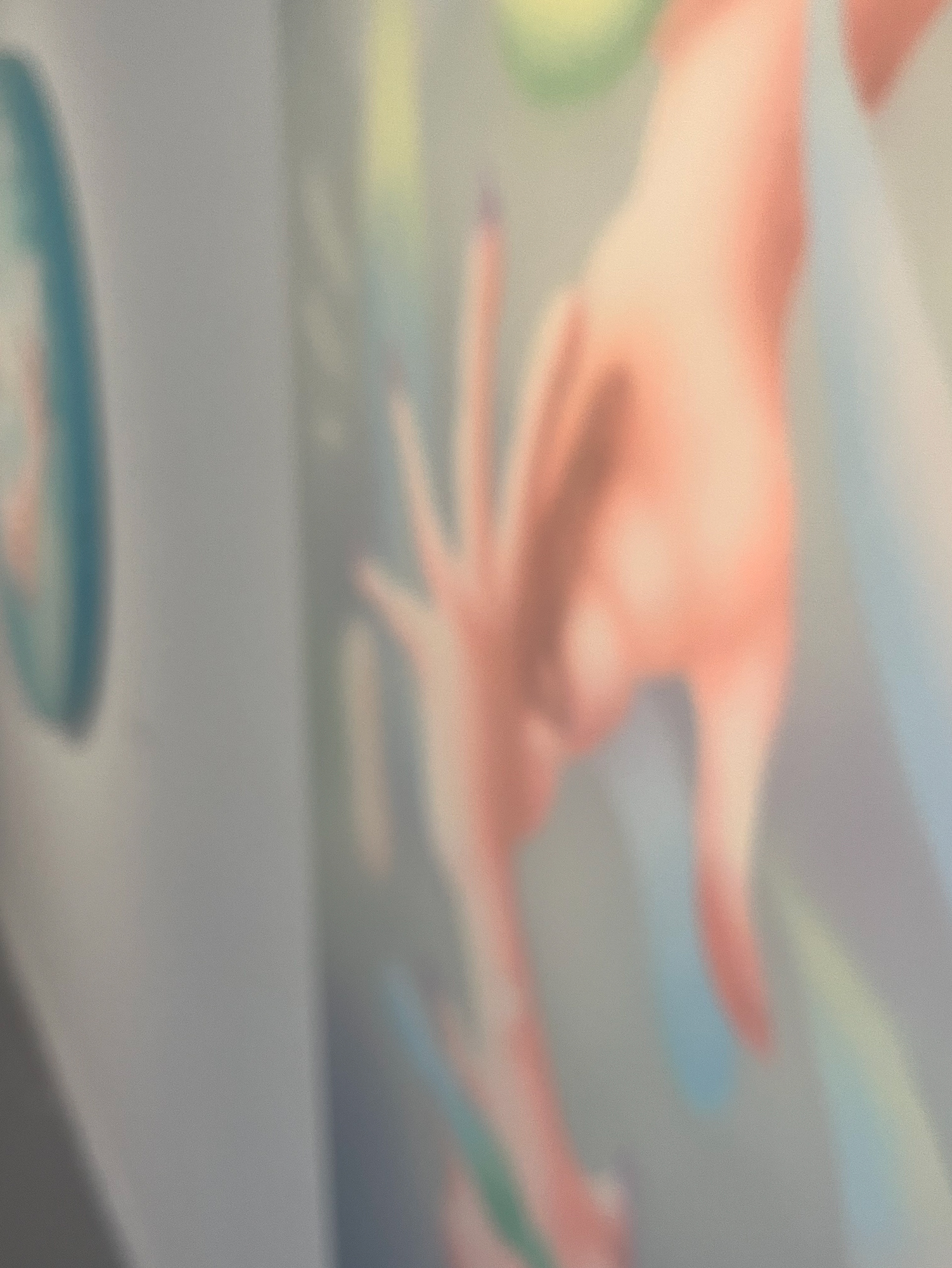김여준
왼쪽, 270도, 외부, 멀리, 위로… 방향과 원근을 비롯한 공간 설정에는 기준이 필요하다. 공간을 인식할 때, ‘나’는 이미 기준으로 거기에 있다. 구획된 캔버스 앞에 선 관람자는 전시장 공간 내에서 그리고 작품 앞에서 자연히 기준이 된 자신을 발견한다.


특정 공간을 연상시키는 이 선들은 이전에 보았던 무엇일까, 그로부터 파생된 보편적 특성일까? 내가 보는 이 선들을 존재하는 풍경을 재현한, 외부의 것으로 봐야할까, 그로부터 발견된 내재적 특성으로 봐야할까? ‘내재적 공간’에 대한 물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우린 지금 어디에 서 있나? 틀 위에? 틀 안에?
틀은 무자비하게 확장되지 않는다. 캔버스의 틀은 바깥 테두리로부터 안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부로부터 바깥을 향하여 형성된다. 중심에는 내가 섰다. 틀을 부수는 것은 바깥으로부터의 작용이다. 틀은 딱 그러해야할 만큼, 필요만큼 확장하여 만들어진 당위의 형태다.
선으로 구획된 그림으로부터 출발하여 저 멀리 있는 특정 도시에 뚝 떨어지든 새로운 공간에 들든, 당도하는 곳은 결국 그곳을 그리는 ‘나’이다. 관람자가 떠올린 바 즉, 지금 관람객 내면이 바로 이곳이다.


그렇다면 작품은 관람객을 초과하지 않는 감상만을 가능케 하는 것일까? 그렇다. 다만 내재한 것들을 발견하는 것은 ‘단지 그만큼’이 아니다. 작품은 파고들어 퍼진다. 우주에 내재한 우리는 우주라는 거시의 세계에서도, 나라는 미시의 세계에서도 그 스케일을 혼동하며 정신없이 길을 잃곤 한다. 알다시피 자신 안에서 특히 더 자주 그렇다.
인정할 것들이 있다. 1) 작품은 내가 알고 보는 만큼을 초과할 수 없다. 2) 나는 내재하였거나 내재해 있다. 3) 그리고 나는 나를 모른다.
2025.03.
김여준 @kimyo_jun